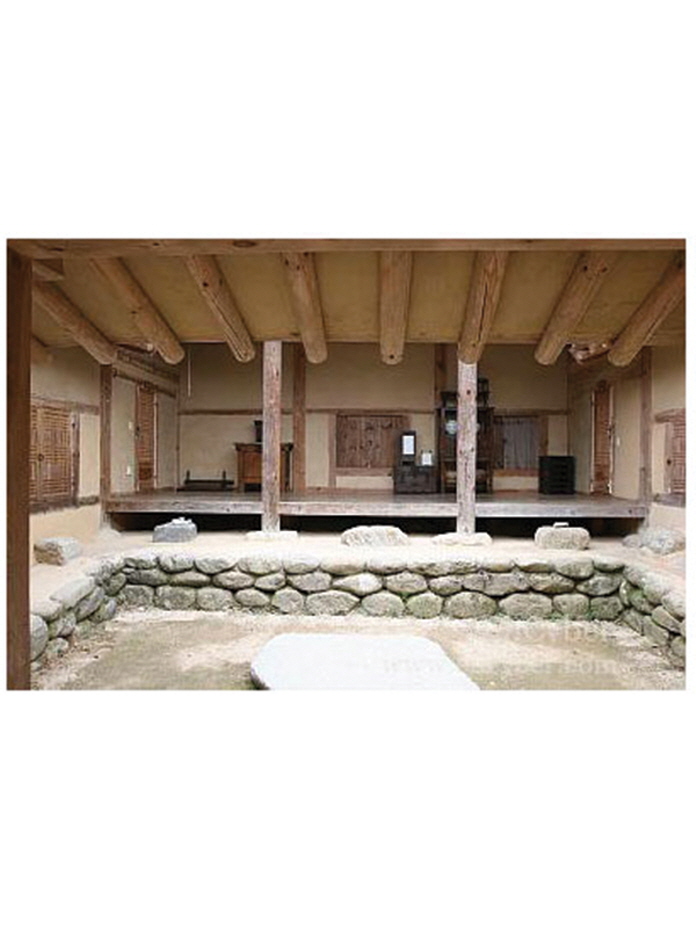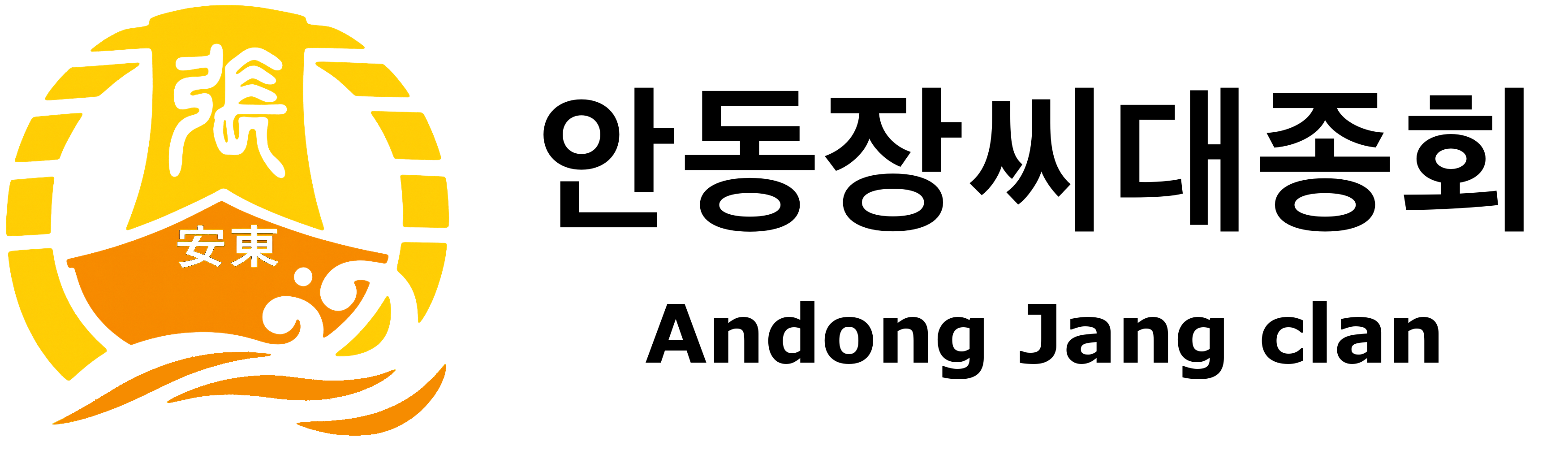통합 검색
통합 검색
안동장씨의 유래
안동 장씨(安東張氏) 연원(淵源)
안동 장씨의 시조(始祖)는 장길(張吉)이며, 자(字)는 영보(寧父), 호(號)는 포음(圃薩)이고, 시호(諡號)는 충헌(忠獻)이다. 후일 장정필(張貞弼)로 개명하였다.
신라 하대에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라는 직함으로 해상권을 장악하며 활약한 해상왕 장보고(張保皐)의 현손자(玄孫子,4대손)로 장보고 장군이 안동장씨의 비조(鼻祖)가 된다.
장씨의 기원
장보고 장군의 자(字)는 정집(正集)으로 어릴 때 이름은 궁복(弓福)인데 궁파(弓巴)라고도 하였다. 궁복이나 궁파는 이두의 한자식 표현으로 활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장군의 아버지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소흥부(蘇興府) 용흥(龍興) 사람으로 당나라에서 중랑장우복야(中郞將右僕射)를 지냈으나 신라 경덕왕 (750년경) 때 신라로 귀화하였고 장군은 신라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당나라에 들어가 무령군(武寧軍)에서 소장(小將)을 지냈고,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가 되어 1만명의 군사로 당과 왜의 해상무역을 장악하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836년 신라의 왕위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김우징(金祐徵: 후일의 신무왕)의 세력이 청해진에 도피하여 재기를 모색하고 있을 때 838 년 다시 왕위를 둘러싼 정변이 일어나자 장보고 장군은 경주로 출병하여 김우징을 강력히 지원함으로써 신무왕(神武王)의 즉위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이에 신무왕은 감사의 뜻으로 장보고 장군을 감의군사 (感義軍使)로 임명하는 한편 장군의 딸을 왕비로 삼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신무왕이 갑자기 서거(逝去)하고 문성왕(文聖王)이 등극한 후 842년 3월 문성왕은 선왕의 약속을 이어 장보고 장군의 딸을 두번째 왕비로 맞아들이려 하였으나 중앙정부를 위협할 만큼 강한 청해진의 세력이 중앙정계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 조정의 귀족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청해진과 중앙정부 사이의 반목과 대립의 골이 깊어 가던 중 조정에서 염장(閻長)을 청해진으로 보내 장보고 장군을 암살함으로써 청해진은 붕괴되고 장군의 가신과 막료(幕)들은 원래의 활동 무대이던 당나라의 적산촌(赤山村)으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벽골군 (碧骨郡: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으로 강제 이주되었다.